[기자가만난세상] ‘친환경’ 찾아 삼만리
 추석 연휴 동안 경기도 인근에 사시는 부모님댁에 다녀왔다. 오갈 때마다 짐이 만만치 않은데, 명절을 보내고 집에 돌아올 때면 짐이 훨씬 더 늘어난다. 부모님이 텃밭에서 기른 채소들을 바리바리 싸주신 덕분이다. “마트에서 다 살 수 있으니 괜찮다”고 말씀드려 보아도 “전부 다 농약 안 치고 깨끗하게 키운 거다. 이런 거는 흔하게 못 산다”면서 억지로 안겨주신다. 그러면 못 이기는 척하고 적당히 받아안는다. 명절 때마다 늘 거치는 과정이다. 누구나 비슷한 추석을 보냈으리라 생각한다.
추석 연휴 동안 경기도 인근에 사시는 부모님댁에 다녀왔다. 오갈 때마다 짐이 만만치 않은데, 명절을 보내고 집에 돌아올 때면 짐이 훨씬 더 늘어난다. 부모님이 텃밭에서 기른 채소들을 바리바리 싸주신 덕분이다. “마트에서 다 살 수 있으니 괜찮다”고 말씀드려 보아도 “전부 다 농약 안 치고 깨끗하게 키운 거다. 이런 거는 흔하게 못 산다”면서 억지로 안겨주신다. 그러면 못 이기는 척하고 적당히 받아안는다. 명절 때마다 늘 거치는 과정이다. 누구나 비슷한 추석을 보냈으리라 생각한다.
사실 두 살도 안 된 딸아이를 키우다 보니 이런 채소들로 냉장고를 가득 채우는 것은 참 든든한 일이다. 이 채소들은 진짜 ‘친환경’이기 때문이다. 분유를 떼고 이제 막 밥을 먹기 시작한 지 4개월여. 지금 우리집의 식생활은 모두 아이에 맞춰져 있다. 아내는 아이가 생애 처음 접하는 음식들을 가능하면 좋고 깨끗하며 건강한 것으로만 먹이려고 노력 중이다. 그러다 보니 찾게 되는 게 ‘친환경’ 농산물이다. 아기가 생기기 전에는 달걀이나 사려고 가끔 들르던 친환경 농산물 전문점을 이제는 고정 방문하게 됐고, 역시 전에는 거들떠보지도 않던 대형마트의 비싼 친환경 코너도 항상 거쳐 간다. 원하는 채소가 없을 때는 여러 전문점이나 마트를 순회하는 경우도 있다. 그야말로 ‘친환경 찾아 삼만리’다.
솔직히 이런 친환경 농산물이 뭐가 얼마나 더 좋은 것인지는 모르겠다. 공산품과 달리 농산물은 외관만으로는 전혀 다른 부분을 찾을 수 없다. 단지 ‘지금 구입하는 식재료가 나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바람만 가져볼 뿐이다. 재배와 유통과정에서 건강한 식재료 관리는 너무도 마땅한 일이지만 그 당연한 일조차 다하지 않았을지 모른다는 막연한 불안감이 ‘친환경’ 마크를 찾게 만든다.
추석에 한 박스 가득 싣고 온 부모님이 가꾼 텃밭채소는 이 같은 마크가 없어도 마음 놓고 아이에게 먹일 수 있지만, 누군지 모를 생산자가 재배한 채소는 함부로 먹일 수 없다. 그래서 결국 사람이 아닌 정부가 인증했다고 하는 스티커 한 장을 믿게 되는 것이다. 채소가 아닌 공증을 상징하는 스티커 한 장에 돈을 더 지불하는 셈이다. 물론 이 ‘친환경’조차도 “이건 깨끗한 채소다”라는 부모님의 한마디에 비하면 그 믿음이란 한참 떨어지는 것이다. 그래도 어쩌랴. 막연한 믿음이나마 구입하는 수밖에.
문득 ‘친환경’ 마크조차 믿을 수 없는 날이 올지도 모른다는 걱정이 든다. 마트에서 아무 상품이나 들여다봐도 서너 개씩은 찍혀 있는 인증마크들…. 우리는 ‘친환경’이 아닌 또 다른 믿음이 담긴 스티커를 찾아 헤매게 될 테고 더 비싼 비용을 지불하며 구입하게 될 것이다. 서글픈 일이다. 우리 사는 사회가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을 당연히 한다면 이런 스티커 따위에 추가 부담을 하지 않아도 될 텐데 말이다.
결국 방법은 불신을 떨쳐내는 것뿐이다. 식재료는 깨끗하게, 공산품은 튼튼하게, 건축물은 안전하게 만드는 등 기본을 지키기만 한다면 더 이상 스티커를 찾아 헤매지 않아도 된다. 우리 아이가 성인이 되기 전에 그런 날이 오기를 바라며, 일단은 부모님이 주신 채소를 마음 편히 먹이기로 한다. ‘친환경 찾아 삼만리’를 안 해도 되는 세상에 살고 싶다.
서필웅 문화체육부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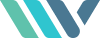 뉴스
뉴스
![[포토] 위클리 '반가운 손인사'](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2/03/07/20220307514808.jpg)
![[포토] 위클리 박소은 '멋진 무대 기대하세요!'](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2/03/07/20220307515108.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