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파원리포트] 섣부른 민식이법 개정론 유감
 “길에 재를 버린 죄는 가벼운데, 손을 자른다는 벌은 무겁습니다. 옛사람들은 어찌 그리 엄합니까.”
“길에 재를 버린 죄는 가벼운데, 손을 자른다는 벌은 무겁습니다. 옛사람들은 어찌 그리 엄합니까.”
공자에게 제자가 물었다. 고대 은나라에는 길에 함부로 재를 버린 사람을 단수(斷手)하는 형벌이 있었다. 과잉처벌 아니냐는 자공 질문에 인의를 강조했던 스승의 답은 뜻밖이다. 사소한 행위가 다툼을 야기하고 결국 삼족상잔(三族相殘)의 화를 불러온다며 법을 옹호했다. “(사람들이) 재를 안 버리는 것은 쉬운 일이고, 손이 잘리는 것은 싫어하는 일이다. 쉬운 일을 하게 해 싫어하는 일에 얽히지 않도록 하는 것을 옛사람들은 쉽다고 생각해 그렇게 한 것”(한비자 내저설 상)이라는 설명이었다.
민식이법이 시행 3개월도 안 됐는데 시비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차에 치여 숨진 고 김민식(당시 9세)군의 안타까운 사고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개정됐다.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어린이를 숨지게 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다치게 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법시행 당일인 3월25일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 과잉처벌이라며 올라온 개정요구문에 34만여명이 동의했다. 결국 최근 정부가 공식 답변을 내놨다. “법률 취지는 운전자가 더 주의하면서 운전할 수 있도록 경각심을 가져 궁극적으로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이라는 지극히 당연한 내용이다.
경험적으로 말하자면, 한국의 운전자는 여전히 사람 목숨보다 차가 우선이다. 다른 선진국에 비해 보행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경각심이 현저히 낮다. 덴마크 출장 시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사람이 먼저 건너가기를 기다리던 승용차와, 한국에서처럼 차가 먼저 지나가기를 기다리던 신선한 신경전을 잊을 수 없다. 과거보다 시민의식이 퇴행했다는 일본에서도 무신호등 횡단보도가 아무리 짧아도 사람이 건널 때 차량이 정지선에 서지 않는 사례를 보기 쉽지 않다. 한국에선 횡단보도가 안전지대가 아니다. 브레이크가 고장 났는지, 오히려 가속페달을 밟는지, 돌진해 오는 위협을 경험해봤으리라.
얼마나 많은 새싹을 짓밟아야 죽음의 페달질을 그만둘 것인가. 2014∼2018년 한 해 평균 어린이 교통사고는 1만1301건이나 발생해 1만4023명이 다치고 55명이 소중한 목숨을 잃었다고 한다. 스쿨존 사고는 한 해 평균 492건으로 부상 516명, 사망 6.2명에 달한다. 민식이법 시행 후에도 스쿨존사고는 계속된다. 과속, 불법 유턴이 이어지면서 또 사망 사건이 발생했다. 스쿨존 추격전이라는 엽기적 일도 있었다. 한 광역지자체 내에서만 법시행 후 최근까지 스쿨존 내 속도 및 신호위반 단속 건수가 1만5255건에 달했다는 경찰 집계가 발표됐다. 어른의 부주의로 여전히 수많은 어린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벌써 형량 완화를 운운하다니.
스쿨존 교통사고는 재를 버리는 것보다 그 죄가 가볍지 않다. 자녀가 먼저 세상을 떠나거나 영원히 장애를 가지면 한 가족이 무너져내린다는 점에서 가정파괴 범죄다. 작가 박경리는 1950년대 세 살 아들이 숨지는 참척(慘慽)의 고통을 겪었다. 그는 자신의 삶을 육체를 거세당했던 사마천에 비유해 “인생을 거세당했다”는 시구를 남겼다.
결국 사람을 존중하는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 대규모 인명이 희생된 한·일의 사건·사고 유형을 비교하면 주목할 점이 있다. 일본에서 주로 지진·태풍과 같은 자연재해나 개인적인 범행에서 발생한다. 한국의 경우엔 대형 참사가 대체로 화재, 붕괴, 중독, 침몰 등 사회적인 인명 경시로 인한 법규 미이행과 방심이 불러온 인재(人災)다. 반복되는 물류센터 화재나 사업장의 코로나19 집단감염도 그 사례다.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횡단보도 정지선 일단정지, 횡단보도 10m 내 주정차 금지 등 기본적 법규만 지켜도 교통사고 인명피해의 상당수를 줄일 수 있다.
스쿨존과 횡단보도는 절대적 안심지대여야 한다. 여기서 불안을 느낀다면 제대로 된 공동체라고 할 수 없다.
김청중 도쿄특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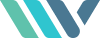 뉴스
뉴스
![[포토] 위클리 '반가운 손인사'](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2/03/07/20220307514808.jpg)
